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
권혁란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전 편집장이자, 오랫동안 책을 만들고, 글을 써온 권혁란 작가는 무의미한 고통에 시달리다 느리게 죽어간 엄마의 날들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온몸은 보랏빛 반점으로 뒤덮이고 깡마른 뼈와 피부 사이의 한 점 경계 없는 몸으로, 제 발로, 제 손으로 용변조차 볼 수 없어 도우미의 손을 빌려야 했던 엄마의 모습을 진솔하게 써내려간다.
저자는 '늙은 부모'를 모시는 '늙은 자식'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꼬집는다. 백세 시대·장수 시대는 과연 축복인지 재앙인지,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시대에 노인 부양의 책임이 오롯이 한 가족에게만 있는지 되묻는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도움을 받는 자식들에게 '부모를 버리고 패륜을 저지른 자식'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시선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책속에서
장례식장에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이 앓다 죽은 낯선 병명을 거의 다 들을 수 있었다. 맑은 소고기 뭇국, 벌건 육개장을 앞에 두고 당신의 엄마가, 너의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얼마나 앓다가 돌아가셨는지 묻는 것은 어쩌면 위로의 말이라기보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늙고 아픈 엄마 아버지 상황을 위안하고 싶은 안간힘이기도 했다. 그동안 보살핌의 노고와 수발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귀를 빌려주는 시간이기도 했고 부모를 잃은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슬픔의 시간을 하소연할 수 있는 입을 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매일매일 혼자 방 안에 갇혀 있는 노인들이나 그 노인들을 두고 자기 삶을 사는 자식들이나 누굴 탓할 게 아니었다. 누가 학대할 마음으로 부모를 붙잡아 두겠는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려고 숨 쉬고 움직이겠는가. 한 공간에 다른 존재 둘이 갇혀 살다 보면 둘 다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존재가 존재를 미워하게 되는 것,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대를 괴롭히게 되는 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엄마와 딸 사이라도 다를 것은 없다.
드디어 엄마의 이름이 불렸다. 반짝 정신이 든 엄마를 부축해 의사 앞에 인도하려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엄마가 굽었던 허리를 쫙 폈다. 양 옆에서 끼지 않으면 잘 걷지도 못하시더니 별안간 뚜벅뚜벅 진료실의 권 선생을 향해 내 손도 뿌리치고 곧장 혼자 걸어가시는 거였다.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당연히도, 권 안과 권 선생님은 엄마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특별히 대하지도 않았다. 하루에 100여 명 넘는 환자를 보는 의사가 몇십 년 전 평범한 할머니를 기억할 리 없는 일.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므로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제때 먹이는 간호조무사가 출퇴근하는 정도이므로 처방약으로 증세가 낫지 않으면 바로 노인 병동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요양원에 있는 시간과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비슷해졌다. … 요양원은 단지 가정집의 대체 장소다. 치료가 아닌 가료와 요양을 하는 곳이므로 아프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집에서 가족이 돌보다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는 것과 같다. 병원으로 보내지 않으면 방치나 학대한 것이 된다.
평생을 착하게만 산 것 같은 엄마가 불분명한 의식 끝에 남을 욕하면서 그야말로 눈에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텅 빈 눈과 분노에 찬 말들이 응급실 구석구석을 저렁저렁 울렸다. 아픈 애기를 안은 여자가, 붕대를 감은 남자가, 황망 중에 찾아온 보호자들이 놀라지도 않고 무심하게 우리 쪽을 돌아봤다. 참혹했다. 이토록 평생을 갉아먹은 남 말의 하찮은 표현 하나와 그것이 들어가 박힌 엄마 마음자리의 깊은 아픔이라니. 엄마는 물기가 없어 자꾸만 목 뒤로 말려들어가는 혀로 여섯 번을 반복해 박혀 있는 칼 같은 말을 빼내고 있었다. ‘섬망’이었다.
겨우겨우 긁어 올린 효심으로 하루이틀 엄마, 엄마 울며불며 옆에 앉아 있다가 훌쩍 가는 자식 말고 정확한 사람이 필요했다. 제대로 돈을 받고 엄마를 챙겨줄 프로 간병인, 프로 요양사, 프로 영양사가 필요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동문서답으로 몇 시간을 보낸다 해도 옆에서 떠들어줄 동년배 할머니 친구들이 있는 곳이어야 했다. 아프면 업고 가다 쓰러지는 늙은 자식 말고 들것에라도 신속하게 싣고 가줄 튼튼한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야 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 내 발로 걸어가 내 손으로 용변을 처리하다 세상 떠나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수치심과 미안한 감정이 쟁쟁하게 살아 있는 정신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천장에 시선을 두고 내 몸이 아닌 양 거리를 둔 엄마의 모습은 무참하고 슬펐다. 내가 딸을 키울 때처럼 엄마의 두 다리는 하늘로 들려지고 사이사이에 낀 변을 닦느라 아랫도리가 드러나고야 말았는데, 생전 처음이었다. 언제 엄마의 아랫도리를 그렇게 훤하게 볼 수 있었으랴. 엄마의 거기는 갓 태어난 여아처럼 무구하고 무방비했다.
생명은, 그냥 ‘꼴까닥, 뚜우’ 하고 끊기는 게 아니다. 서서히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이 병실은 이제 임종의 방이 될 것이다. 엄마 다리 왼쪽은 나무토막처럼 뻣뻣하다. 나무토막을, 바싹 마른 장작을 만져봐서 안다. 갈라진 무늬나 질감마저 온도마저 정말로 나무토막처럼 거칠고 딱딱하다. 부드러운 살이라곤 하나도 없이 다 흘러내려서 더더욱. 손은 부었다 식었다, 가라앉으며 천천히 소멸을 향해 마지막 항해 중이다. 자는 듯이 죽었다는 게, 돌연히 죽었다는 게 축복인 것을 온전히 알겠다.
나라도, 저렇게, 죽지는 말아야지.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밀린 잠에 빠지면서도 이를 앙다물고 각오를 다졌다. 아들이, 딸들이, 수없이 오고 가고 교대하고 손을 만져도 아무것도 모르고, 몸 안의 모든 것을 다 빼내고, 쏟아내고, 다 썩어갈 때까지 임종도 못 하는 그런 가혹한 마지막 날들을 살지는 말아야지. 어딘지, 누군지도 모를 이에게 화가 막 솟구쳤다.
환자는 살아 있는 동안, 매일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배가 부를 만큼 진통제를 수십 알씩 먹고 팔뚝이나 손등이 새파래질 때까지 주사를 맞아야 한다. 목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밥물을 위로 집어넣어야 한다. 오줌이 관을 통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똥은 막을 수 없이 터져 나온다. 환자 본인의 고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안 받게 하려면 엄청난 죄책감에 빠진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닐까.’ ‘살 수도 있을 텐데 성급하게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별의 고통도 작별의 아픔도 아직은 경험해본 적 없는 그늘 적은 딸들이니 다행이었다. 나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어서, 애들이 엄마를 어디에 부탁할 생각조차 없이 투명하니 맑아서 차라리 좋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영어로 ‘Advanced Medical Directives’였다. 미리 인생의 마지막을 부탁하는 의학적 방향. 선명하게 정확해서 큰 보험 하나 들어둔 것처럼 뒷배가 든든하다. 이제 조금만 더 정리하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된다.
‘없어서 그래. 없어져서 그래. 있다가 사라져서 그래.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그래.’ 그런 날들이 자꾸자꾸 살아지면서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처음으로 아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상하다. 살려면 생기를 찾아가야 하잖아, 왜 기를 쓰고 시들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기운만 찾게 될까. 사람이 만나 눈이 맞고 떨면서 사랑을 시작하거나 환하게 웃는 이야기는 소설이든 시든 영화든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러다 죽을 것을’ ‘저러다 헤어질 것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들 애쓰잖아’.
이 책을 추천한 크리에이터
이 책을 추천한 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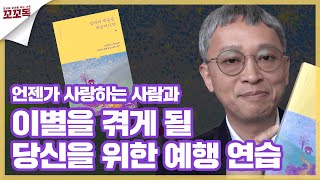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겪게 될 당신을 위한 예행 연습 | 엄마의 죽음은 처음이니까-권혁란 | 꼬꼬독 ep.44
오늘 꼬꼬독에서 언젠가 늙은 부모와 이별을 겪게 될 자식들에겐 공부가 되고 이미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 보낸 사람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책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스펜서 존슨(Spencer Johnson) (0) | 2020.04.28 |
|---|---|
| 1% 유대인의 생각훈련 - 심정섭 (0) | 2020.04.28 |
| 직장인의 돈 공부 - 박철 (0) | 2020.04.28 |
| 당신이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 탄윈페이 (0) | 2020.04.27 |
|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 - 에릭 와이너(Eric Weiner) (0) | 2020.04.27 |




